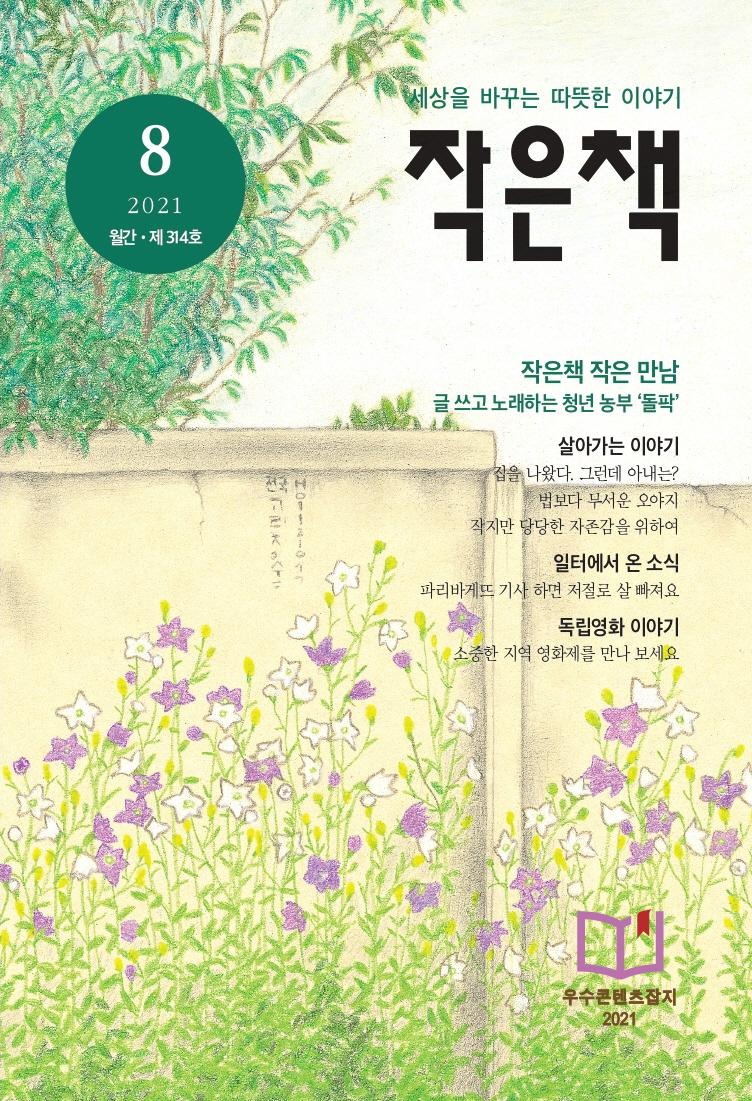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20년 9월호
일터 이야기
일터에서 온 소식
우리는 어떤 내일에 닿을까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기획실장
복직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이름을 바꾼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개명까지 할 정도라니,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다. 한둘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다. 해고자도 있고 희망 퇴직한 사람도 있었으니 굳이 해고자에게만 국한시킬 일은 아니었다. 아들과 함께 개명한 형(동료)도 있다. 살면서 이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개명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처한 저간의 사정이다. 몸부림을 쳐 봐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였다 싶을 때, 그 시간이 개명의 때가 아닐까 싶다. 쌍용차에도 이름 바꾼 힘까지 보태졌던지 개명한 형들 또한 이번에 모두 복직을 이뤄 냈다. 지난 5월 4일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복직했다. 자그마치 10년 하고도 11개월 만이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줄곧 공장 밖에서의 삶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도 시작된 것이다. 11년 동안 직원들 상대로 피켓 들고 섰던 정문 앞에서 시업 종소리 들으며 공장이 아닌 노조 사무실로 향하던 씁쓸한 어제는 없다. 출근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하는 동료들의 등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던 지긋지긋하던 그 일상도 이제는 안녕이다.
▲ 지난 5월 4일 가진 마지막 복직자들의 기자회견. 사진_ 이창근
입사 동기인 정민이도 11년 만에 복직자 명단에 있었다. 그 사이 펄펄 끓던 서른두 살 청춘의 꿈틀거림은 지렁이처럼 마른 눈물 자국만 남긴 채 온데간데없이 휘발했다. 세월의 바코드라도 찍힌 듯 마른 근육과 까만 피부가 특별히 더 애달팠다. 이제는 40톤 트레일러를 몰지 않아도 되고 4대강 사업 끝물에 올라탔던 육중한 덤프에도 오르지 않아도 된다. 처가댁에 해고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명절 때마다 일 있다는 핑계 들어 더 이상 걸음 끊지 않아도 된다. 정민이는 11년 동안 해고자 신분을 처가와 친인척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누구 하나 묻지 않았던 것일까. 질문 가능한 공간을 피해 왔던 것일까. 이해되지 않지만 해고자 생활 11년은 통상적인 이해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다. 정민이뿐만 아니라 몇몇 동료들 또한 해고 사실을 용케 숨기며 11년을 살아 냈으니까. 적어도 개명은 사회생활을 전제로 한다지만 있는 이름조차 쓰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서 유폐시키는 삶 또한 그 속내가 얼마나 복잡했던가.
복직한 이들은 요즘 빚 갚는 데 여념이 없다. 월세 살던 후배 한 명이 적은 돈 모으고 은행 대출 껴 전셋집으로 들어갔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 내 일처럼 기뻤다. 장마철만 되면 빗물이 새고 장판은 뜨고 벽지가 곰팡이로 변하는 집에, 그것도 얹혀 살던 또 다른 후배 또한 깨끗한 새 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했다는 소식도 무척 기뻤다. 아이가 다섯인데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복직의 참 의미가 아닐까도 싶었다.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혼 위기였던 형들의 어두컴컴한 집에 환한 LED 전등이 다시 하나둘 켜지고 있다. 오십 넘어서도 용돈 타 써야 했던 부모님께 이제는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피켓 들고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이들의 냉대와 작은 기사에도 여지없이 달리는 그 악다구니 댓글에도 11년 동안 견뎠다. 비닐 천막 밑으로 흐르던 빗물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꼭 쥐었던 그 사소하고 소소한 작고 숱한 다짐들을 하나둘 이뤄 낼 수 있는 이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가. 출퇴근길에서 보는 형들의 웃는 얼굴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는 요즘이다.
함께했던 동료들끼리 복직해서는 자주 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생각이 바뀌었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 봐야 할 곳도 늘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또한 길어졌다. 훌쩍 커 버린 아이들과 부쩍 야윈 부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을 더는 미뤄 두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중으로 무작정 미뤘던 일들이 하나둘 내 일로 몰려들고 애써 외면했던 경조사에도 이제는 꼬박꼬박 찾아가야 한다. 해고자라서 열외로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열에 합류도 해야 하고 끼어도 봐야 한다. 이것저것 핑계 대기에는 사회가 허용하는 나이로부터도 한참을 벗어났고 통용되는 상식도 외면할 염치가 더 이상 없다. 늦게나마 추스를 수 있는 염치가 생겨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그저 일상이라는 이불을 덮고 아늑하게 드러눕고만 있기에는 바닥이 무척 차갑다. 해결되지 않은 쌍용차 손배 가압류 법정 이자만도 초 단위로 불어나 어느새 40억이 넘었다. 정권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바뀌어도 감감무소식인 쌍용차 손배 가압류 문제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밥 먹을 때마다 따끔거린다.
▲ 지난 2월 복직 연기 발표에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항의하는 복직 대기자들. 사진_ 이창근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억의 순간이 다르다. 가해자는 가해의 순간이 아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자기 행동의 근거와 알리바이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해의 과정이 아닌 피해 그 순간과 그 이후를 기억한다. 그런 면에서 둘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그저 조정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쌍용차 해고 사태는 그런 점에서 공장 안에서는 회피되고 있다. 직면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의 유속만 믿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저 그 시간 속에서 씻겨 나가기만 바라는 것 같다. 피해자라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선이다. 가해자 또한 마찬가지다. 4년 먼저 복직한 나로서는 이 내재하는 갈등이 가끔 두렵다.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입 닫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지 자주 두렵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손해로 때론 낭패로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 스스로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복직한 이들의 생의 가장 따뜻한 날들이 길어지길 바라는 마음까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는가.
내 노트북 바탕 화면은 파업 당시 공장 옥상에 걸터앉은 동료들의 사진이다. 모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2009년 7월 말의 맑은 여름날이다. 옥상 위로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작게 잡혔다. 지난 해고 기간 동안 나는 이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다짐도 했다. 우리는 반드시 내일에 가 닿겠노라고. 그러나 어떤 내일인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영글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함께 살자는 구호가 자음과 모음이 되어 만들어 내는 어떤 말이었으면 했다. 모두가 복직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내일은 어떤 날이어야 할까. 아니 어떤 내일이면 기쁘고 즐거울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개인으로 친절과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우리가 복직 과정에서 축복처럼 받았던 수많은 연대와 사랑과 기쁨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 흘러 나갔으면 좋겠다. 장영은 작가의 말처럼 ‘나의 고통을 과장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의 품위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더더욱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