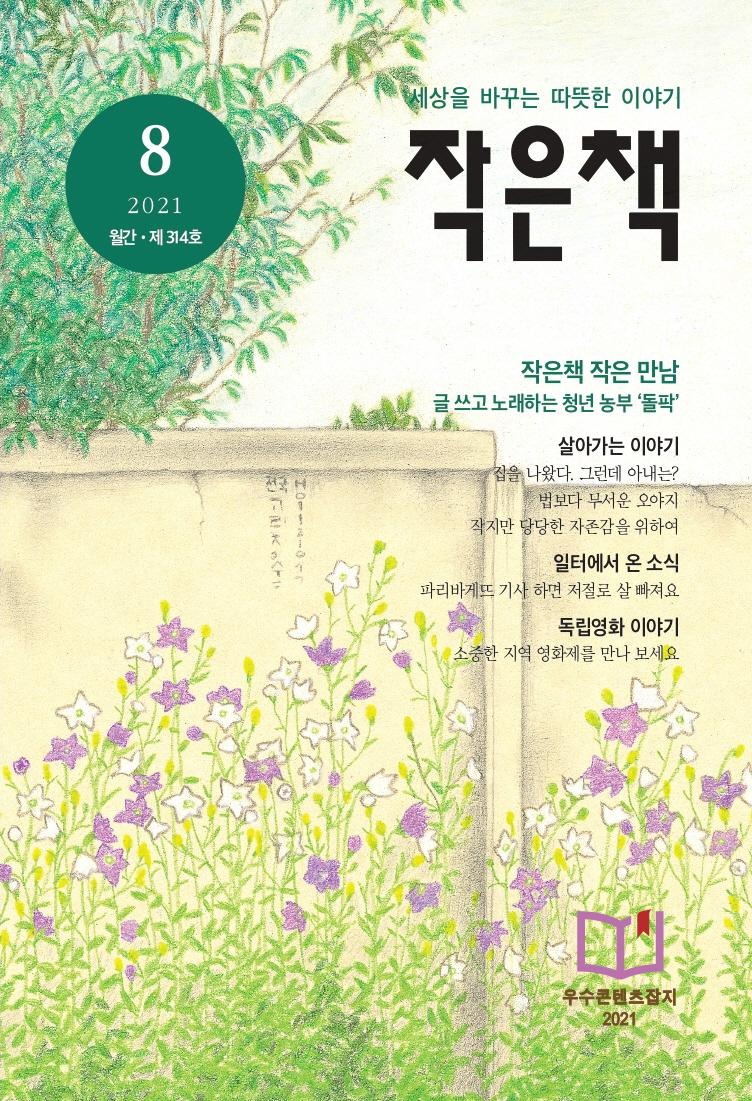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09년 4월호
쉬엄쉬엄 가요
추억따라 역사따라
짱돌의 역사
박준성/ 작은책 편집위원, 역사학자
나뭇가지에 잎눈 꽃눈이 터질 듯 커졌다. 빨리 자란 냉이는 벌써 하얀 꽃이 피었다. 둘째 아이 학교 가는 길가 밭 군데군데 퇴비 푸대가 늘어져 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좀 거들어 보았다고 봄이 되면 몸이 근질근질해진다. 학부모들이 학교 학습장 귀퉁이를 얻어 텃밭 농사를 짓는 데 끼었다. 산자락을 일군 땅이라 잔돌이 많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산 쪽으로 집어 던져 보려고 서너 개를 집어 들었다. ‘도룡농이나 겨울잠에서 깨어 나오는 개구리 맞을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새싹이 맞을까 미안해서 밭둑으로 옮겼다.
지금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 우리 집은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있다. 뒷문을 열면 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집 둘레 밭은 오랫 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이라고는 하지만 때마다 잔돌을 주어 내도 계속 나왔다. 아버지는 그 돌을 가지고 밭 건너편 산으로 멀리 던지기 시합을 시켰다. 돌팔매질 놀이와 돌 치우는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잔돌 던지며 배웠던 실력이 체력장 멀리 던지기를 할 때 제대로 드러났다.
체력장을 끝으로 돌팔매질을 써 먹을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시대가 ‘짱돌’을 들게 만들었다. 재야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어떤 모임에서든 나를 소개할 때마다 퇴계로 거리에서 짱돌 들고 앞뒤로 오가던 내 모습을 이야기하셨다. 열심히 싸웠던 선수들 보기가 민망스러워 낯이 뜨거웠다.
1986년인가 1985년이었던가. 규장각에서 조교를 하고 있을 때다. 퇴근을 하는데 교문 쪽에 최루탄 가스가 자욱하다. 앞에서 조그만 여학생 둘이 작은 손으로 보도블록을 열심히 깨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안쓰러웠다. 마침 농구선수처럼 키가 장대 같은 남학생들이 옆으로 지나가다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다. 눈앞에 불이 확 붙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은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보다 그 남학생들이 더 미웠다.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치고 싶었다. 국립대학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라 화는 나도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정신없이 보도블록을 깨었다. 손이 얼얼해서 며칠 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뒤에서 보도블록을 깨서 앞으로 나르면 용감한 선수들이 앞에서 던졌다. 창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최루탄을 쏘아 대도 30미터 앞에까지 다가가 물러서지 않고 던지는 선수들이 있었지요” 했다. 마침 <작은책>에 ‘법보다 사람’을 연재하던 박훈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30미터가 아니고 5미터요!” 하고 추임새를 넣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짱돌을 던지다 보면 우리 편 뒤통수 맞히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앞에서 싸우던 선수들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정쩡하게라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힘이 나지 않을까 싶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6월항쟁 때 한편에서 ‘지식인으로서 역사학자로서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전망을 모색하여 알리는 것이 우리 몫’이니 어쩌고 할 때 ‘거리에 나가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목소리는 컸어도 뜻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수록 현장 가까이 가서 구경해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촛불항쟁 때 밤을 새고 ‘명박산성’에 깃발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명박산성 가까이 있던 시위대 속에서 뒤를 보면서 “놀러 왔나. 놀려면 놀이터에 가서 놀든지, 씨발” 하는 욕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앞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영상물을 보고, 모여 앉아 토론하는 무리가 못마땅했나 보다. 앞쪽에 있다고 해도 깃발 들고 나서는 사람 있고, 전경차에 밧줄 걸고 당기는 사람 있고, 나처럼 사진 찍는다고 밧줄 한 번 당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밧줄 당기는 사람 등 밀어 주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듯이, 뒤쪽에서 갖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앞에 있다고 힘이 날까? 강의도 버릇이 된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참았다.
시간이 지나 6월항쟁 때 이이화 선생님 비슷한 나이가 되고 보니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짐작할 수 있겠다. 22년 전 일이니까 내가 30대 초반, 선생님이 50대 초반이었다. 이이화 선생님은 짱돌은 들지는 않았어도 빠짐없이 6월항쟁 거리에 나섰고, 깨진 보도블록 조각을 시위대 쪽으로 밀어 넣어 주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면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만났다는 말로 대신했던 것 아닐까. 제 말이 맞지 않으냐고 여쭤 보고 싶다가도 그냥 지나간다. 그런 것까지 확인하다 보면 세상사 재미가 떨어지지 않겠나.
6월항쟁 때는 보도블록을 깨서 짱돌을 만들어 썼고, 촛불항쟁 때는 짱돌 대신 촛불을 들었다면, 1960년 ‘4월혁명’ 시위대가 들었던 짱돌은 진짜 돌이었다. 4월혁명 때 경무대로 향하는 보도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짱돌에 총으로 대응하였다. 경무대 쪽에서만 21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4월혁명의 직접 계기가 된 3ㆍ15부정 선거 반대 시위를 공산당의 배후 조종에 의한 좌익 폭동으로 몰아갔고, 심지어는 시위대가 던진 돌을 ‘북괴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기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짱돌은 오랫동안 민중의 무기였고 놀잇감이었다. 마을 어귀나 고개 마루에 있는 성황당가에는 돌무더기가 있다. 그런 곳은 초기 부족국가 시대나 통일신라 하대 호족이 곳곳에서 세력을 떨칠 때 방어하기 요긴한 길목이었다. 그냥 걷고 넘기도 힘든데 돌 가져다 쌓아 두라고 하면 모두들 입이 댓 발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돌을 던지며 치성을 드리면 부귀다남하고 무병장수한다니까 오갈 때마다 하나씩 가져다 던진 돌들이 쌓여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렇게 쌓은 돌멩이들은 싸움이 일어나면 무기가 되었다. 사람 손때를 타야 던지기도 좋다.
홍명희가 쓴 소설 《임꺽정》에 돌팔매질하는 재주가 귀신 같은 석전군(石戰軍) 배돌석이가 나온다. 돌멩이로 호랑이를 때려잡기 전 배돌석이가 며칠이나 돌멩이를 던져 가며 길을 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배돌석이는 소설 쓰느라 꾸며 낸 인물만은 아니었다. 돌팔매질 잘하는 고수들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석전놀이를 할 때 영웅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그런 평민들로 구성된 짱돌부대가 있었고, 1894년 농민전쟁 때도 돌팔매질 잘하는 농민들을 따로 모아 만든 부대가 있었다.
짱돌에 담긴 역사와 전통은 오래되었고 책으로 써도 될 만큼 푸짐하다. 지배층이 칼과 총으로 가로막아 온 역사보다는 민중이 짱돌로 만들어 온 길이 제대로 된 역사의 길이었다. 그 길을 일이관지하며 걷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비록 역사의 장면마다 이름 석 자 뚜렷하게 남기지 못했으나 제 길을 버리지 않고 걸어온 분들이 존경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