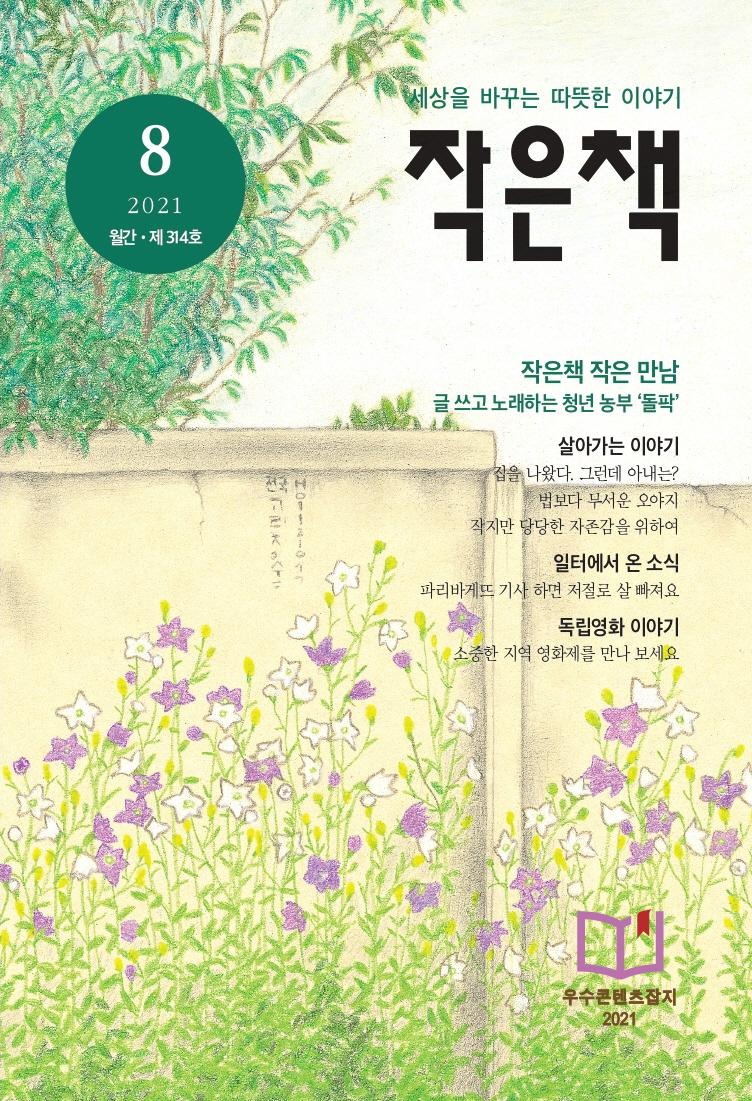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20년 8월호
살아가는 이야기
베테랑 월급이 50만 원 적다
한영미/ 마트 시식 코너 노동자
아무도 몰랐다. 코로나가 덮칠 줄은. 전염병 때문에 지형 구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는 건 내 평생 처음이다.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던 나는 오늘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식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란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난들 목숨 걸고 시식 일하고 싶었을까? 그렇지만 코로나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고 밥은 안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목숨을 최저임금에 걸었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하자 시식을 금지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사실 세상이 이럴 때 마트에서 시식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파리 목숨이라도, 내일 먹을 밥그릇은 빼앗더라도, 숟가락까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 마트 담당자에게 걱정되어 물었더니 자기들은 서울시 공문을 이행할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너희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원들은 마트에 물건을 대는 각자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파견직 사원이므로 이럴 때 마트는 간단하게 사람을 정리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러웠다. 나와 자매처럼 지낸 고정 사원에게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인가를 물었다. 고정 사원 역시 나와 같은 회사에서 파견된 최저임금자이지만 마트에 물건을 진열하는 사원이므로 마트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또 고정 사원은 회사와 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는 ‘곧 나오게 되겠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코로나가 기승인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동안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 변화 없이 일을 다시 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았다. 나는 회사에서 파견된 고정 사원에게 나도 생활하는 사람이니 차라리 해고해서 고용보험을 타게 해 달라고 했다. 나와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냈던 회사 고정 사원은 이상한 논리를 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사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다. 나로선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 심각한 일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즉 고용보험도 뭣도 없이 손가락 빨고 기다리면 자기들 필요할 때 부른다는 이야기다. 나는 마음이 많이 상했다. 오늘 아침 때려잡은 바퀴벌레랑 내가 뭐가 다른가 말이다. 그날 그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와 표정이, 그리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가 서운했다. 나는 고정 사원에게 내 상한 심정을 퍼부었다.
“마음대로 해. 회사가 월급 줄 돈이 없으면 내 4대 보험 내 주겠니? 그때 되면 해고가 되든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 회사에서 일당 짜게 줘서 다른 사람과 돈 차이가 한 달에 몇십만 원 날 때도 난 바보같이 나 없으면 네가 꾸려 갈 이 살림 걱정해서 의리로 참았어. 어쩌면 너는 내가 백수가 될지 모를 이 마당에 회사 입장만 얘기하고 나에 대한 걱정은 없냐.”
우리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내 근무 일수를 줄였고, 다음 해에는 시간을 줄였고, 또 다음 해에는 일급도 줄였다. 그래서 나는 삼 년째 같은 일당을 받고 있다. 일하는 날만 줄어 월급은 이십여만 원이 줄었다. 모든 회사들은 편법으로 돈을 줄여 나갔는데, 버젓이 내놓고 하는 일을 나라에서는 모르는 것일까? 나는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베테랑이다. 그러나 회사의 편법 때문에 최저임금이나마 대우해 주는 회사보다 월급이 50만 원 차이가 났다.
더러워진 기분으로 나는 계속 고정 사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이어 갔다. ‘만일 네가 회사에 얘기해서 내가 고용보험을 타게 해 준다면 다시 나오는 날 내가 이곳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라고.
고정 사원은 사과했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부터 당장 백수가 되었다. 그깟 일 뭐를 하면 이보다 못하랴 싶었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 없는 백수가 되고 나니 참으로 허탈하다. 이놈의 사회에서는 잘 조직되고 복지 혜택 많이 받는 제도권 국민에게만 주고 주고 또 준다.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수기 청소하러 온 아줌마와 이야기했다. 자기들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한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회사의 노예라면서. 그런데도 프리랜서로 등록돼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해고돼도 고용보험도 못 탄다고 했다. 이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린 직업군을 찾아내어 노동조합 결성하는 일에 동참해 볼까?
일주일 뒤, 시식 행사가 재개되고 나는 기약 없는 백수에서 다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행사 알바로 복귀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회사 소속임을 잊고 있었다. 그저 내 일이려니 생각해서 참 우직하니 열심히 일했다. 다시 일하게 된 지금 별로 기쁘지가 않다. 그나마 일할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한 미미함을 깨닫게 되어 기가 죽는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이루지 못할 정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