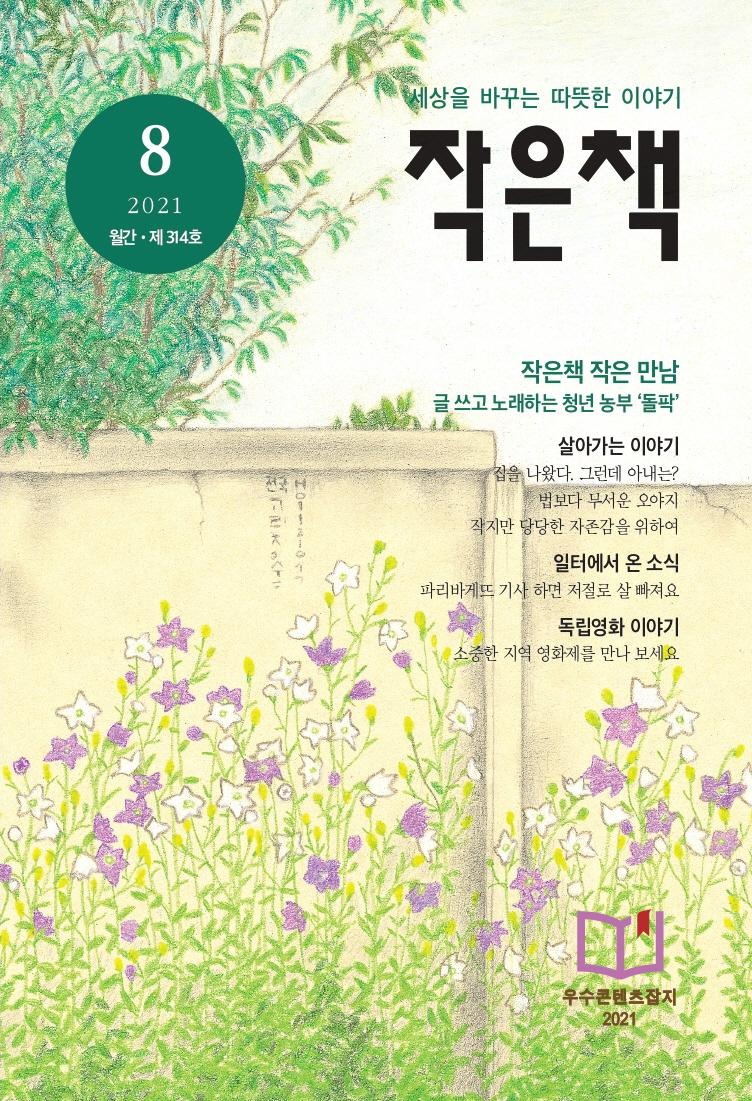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19년 5월호
쉬엄쉬엄 가요
책 읽고 딴 생각_ 《바벨탑 공화국》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19)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변정수/ 출판 편집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가 되곤 하는 ‘갑질’을 그저 예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오히려 워낙 일상화되어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뿐이지, 크고 작은 ‘갑질’을 예사로 당하고 사는 게 대다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벨탑 공화국》에서 강준만은 “우리는 사람들의 좋지 못한 의도와 행위들의 결과로 갑질이 창궐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갑질은 우리가 옳거니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 생겨나”며 좋지 못한 의도와 행위도 실은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질’을 낳는 ‘옳거니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개천에서 난 용을 보면서 열광하는 동시에 꿈과 희망을 품”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확신마저 갖는” 모습이다. “모두가 다 용이 될 수는 없으며, 용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용이 되지 못한 실패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과 패배감을 맛봐야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깨지 않는 한, 지금의 과도한 지역간 격차, 학력·학벌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그에 따른 ‘갑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
이 책 제목의 ‘바벨탑’은 “탐욕스럽게 질주하는 ‘서열 사회’의 심성과 행태, 그리고 서열이 소통을 대체한 불통 사회를 가리키는 은유이자 상징”이다. 이는 바벨탑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상생을 거부하는 ‘탐욕’을 건전한 상식으로 만든 사회, 그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이거니와 “국민 다수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해도 그건 내 손톱 밑의 가시보다 하찮은 일이라는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바벨탑 공화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환기하면서 “바벨탑의 붕괴로 가는 길”이라 진단한다.
‘욕망의 바벨탑’의 이면은 ‘모욕의 바벨탑’이기도 하다. “낮은 서열의 사람을 모욕하는 걸 자기 존재 증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많은 건 물론이려니와 모욕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걸 자신의 위계가 올라가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사코 모든 사람을 일렬종대로 세워 서열을 매기고 그 격차를 크게 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유를 “삶의 만족과 보람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사회경제적 비교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저자가 ‘바벨탑 공화국’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으로 지목하는 건 ‘서울 초집중화’이다. 거칠게 간추리면 지방을 희생한 대가로 서울이 모든 자원을 독식하는 ‘갑질’이야말로 이 나라를 온통 ‘서열 사회’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적잖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난 용’의 첫 번째 조건을 우선 서울에 진입하는 것이라 여기곤 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그 결과 지방은 점점 더 황폐화되는데. 그 피해가 지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령 “도시 인구가 20만에서 10만으로 줄었다고 해도 그 도시의 도로나 수도, 전선, 통신망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는 일”이고 “어느 도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 때문에 “똑같은 면적에 절반의 인구가 살게 되면 재정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올까.
더 의미심장한 건 지방이 식민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조차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워낙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가 바닥이기는 하다. “겨우 한 자릿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권력기관, 10퍼센트대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언론과 종교, 20퍼센트대의 상호 신뢰도를 갖고 있는 국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니까. 그런데 ‘저신뢰 사회’의 부정적 효과는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지방에서 사회적 자본의 약화는 지방 소멸에 대해 저항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주체가 파편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통찰은 비단 지방민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단적으로 웅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