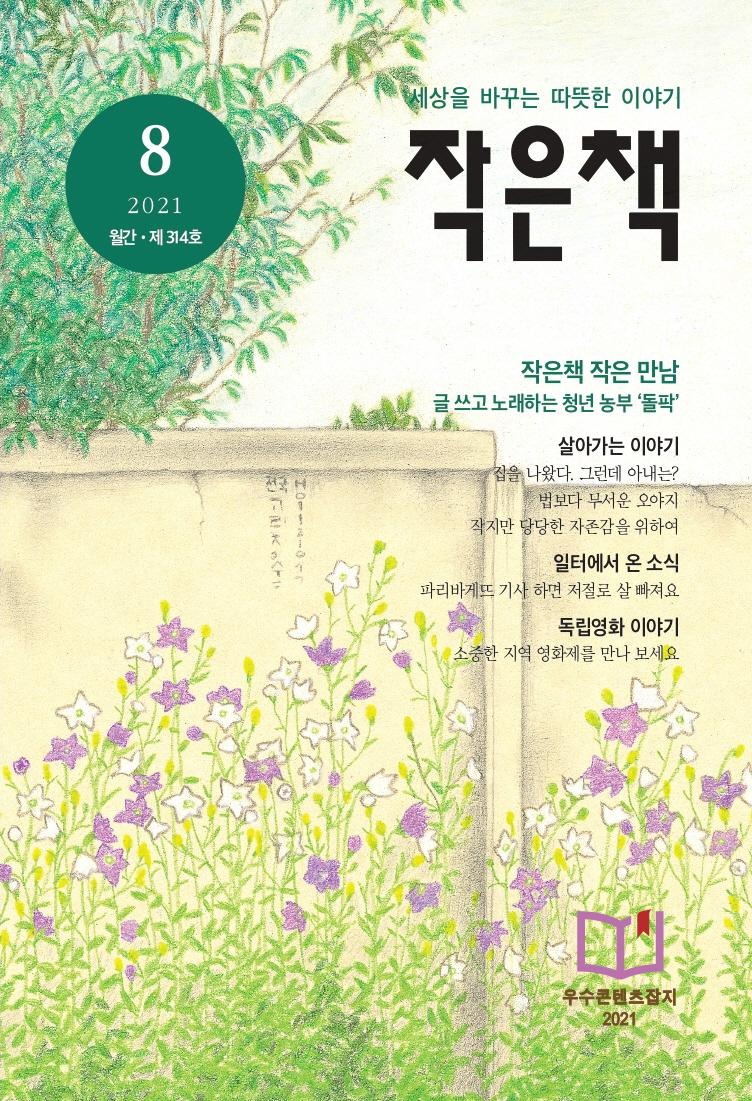2017. 11. 21. 15:15
월간 <작은책>/일터 이야기
MB가 만든 '영전강', 사교육비 절감한다며 뽑더니…
[작은책] "사실혼 인정하고 무기 계약 보장하라!"
"같이 살림 차리고 8년을 살던 놈이 다시 4년 더 살자고 하면서 혼인 신고는 절대 안 해 준대. 당신 같으면 이 X새끼 어떻게 할 거야! 판사도 인정했잖아, 사실혼이라고. 왜 당신들만 쌩까냐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거칠었던 건 아니었다. 나는 친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고, 학창 시절 대단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총명하다는 말을 듣던 모범생이었고, 성장해서는 교통 법규조차 함부로 어기지 않는 시민이 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싹싹하게 웃으며 일했고, 어른들 명절 선물 챙기기에도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에게조차 소홀하게 되어 핀잔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비겁한 놈에게 온 마음을 쏟았다. 누군가는 나에게 혹시 '착한 여자 콤플렉스' 아니냐고 말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참고 살았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상황을 면해 보려 했다. '부당하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처지가 못 되었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다. 설마 했는데 나를 데리고 살던 이놈은 애초부터 나랑 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나 혼자 헛꿈을 꾸었음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민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날까 봐 조마조마하며 눈치 보고 살던 습관은 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 놓았다.

이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4년마다 거듭 해고를 당하며 일하는 비정규직 교사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다. 지난 8월 대전고등법원은 4년을 근무하고 해고된 영전강이 사실상 무기 계약이라고 판결하였으며, 학교장과 계약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전강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임을 인정하여 무기 계약 전환과 고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 바꿀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영전강 제도를 만들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영어 지도안 작성과 영어 수업 시연, 영어 면접 등을 거쳐 6200여 명의 영전강을 선발하여 초중고교로 배치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2조에 영전강의 근무 기간이 4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해고를 반복하는 꼼수를 썼다. 그동안 절반 정도가 일터를 떠나 현재는 3200여 명 남았다.
공개 채용을 거쳐 8년간의 실무를 통해 검증받은 영전강들에게 임용고시를 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이 자격을 인정했음에도 최상위의 기준을 다시 정해 무한 경쟁에 밀어 넣는 논리는 아이들이 경쟁 교육에서 마주하는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전강이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모두가 합격한다 해도 교육부의 생각이 이렇다면 학교는 계속하여 해고하기 쉬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정규직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다시 이 비루한 일자리를 메울 것이다.
머지않아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마구 쏟아 내는 화풀이 식 댓글과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라는 희망 고문에 상처받고 주눅 들어 한없이 우울해졌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고사하고 8년간 15만 원 오른 월급에도 불평 없이 방학에도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무자격자라고 흠을 잡으려 든다. 그들의 주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도리도 필요 없고, 오로지 살자고 발버둥치는 생존 본능의 처절함마저 느껴진다. 가난한 비정규직이 넘쳐 나는 한 이런 진흙탕 싸움은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겪고 지켜본 해고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 살인이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다 걸기 때문이다. 한 영전강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는 것에 저항하여 학교와 말싸움을 벌이다 태아를 잃기도 했다. 교수나 박사님의 해고 또한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나 해고의 위협은 사람의 마음을 하릴없이 좀먹게 만든다.
교원 임용 선발 인원을 깎아 먹는다고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잔인한 왕정의 노예들도 태어날 귀한 신분(정규직)의 앞길을 위해 먼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수년 전 영전강 제도 폐지 서명 용지가 내가 앉은 책상 옆에서 돌던 날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느 집단이나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온 힘을 다해 굴려 내고 싶은 역사의 수레바퀴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 밑에 깔려 다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냈던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을 돌려주겠다던 모 의원님은 줏대가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전강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었다는 말이 옳다. 수년 전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 때 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는 영전강에 대한 댓글로 다운될 지경이었다. 합법적인 후원금조차 낼 수 없게 되자, 내가 어쩌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8년의 학교생활에서 나는 비굴함과 겸손의 차이를 아직 모른다. 나는 아이들에게 겸손하기 위해 비굴함을 선택했다. 어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학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풀 죽어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냥 들여다보였다. 나는 아이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교육학에서보다 한없이 내 몸을 낮추어야 했던 비정규직 생활에서 더 많이 배웠다.
나는 '교사'라는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 일하던 대로 일하도록 고용 안정만 바랄 뿐이다. 내가 만약 학교가 아닌 다른 공공 기관에서 2년을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 계약 대상이 된다. 공공 기관과 학교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 곳인가. 가르치는 일이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혹독한 전문성이 요구되는가. 9년이 아니고 90년을 일하면 인정해 줄 것인가.
추석 명절을 지내며 여성과 비정규직의 삶은 서로 많이도 닮았음을 느낀다. 함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언제나 남에게 해석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는 착하지 않아, 능력이 부족해'라고 끝없이 죄책감을 강요받는다. "임용고시 합격하여 떳떳하게 일하라"라는 말은 영전강의 생각은 들어볼 것 없이 너희는 부정한 집단이라는 누군가의 일방적 해석이다. 짜장면집 주방장이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반드시 세계적 요리사가 되라고 윽박지르는 꼰대의 모습이다. 어느 한 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고 이익을 누리는 쪽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하여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아무리 말단의 일이라도 해고될 걱정 없이 소신껏 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민주주의고 뭐고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하여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강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눈물을 팔아 우리가 옳다고 누구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나를 지지하며 수고를 인정하고 내 노동의 법적 권리가 옳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마치고 밤샘 농성을 하기도 하고 광화문 땡볕 아래서, 교육청에서 싸움을 이어간다. 거기엔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공감도 있어 견딜 만하다. 오늘은 교육부 높은 담장을 향해 소리친다.
"사실혼 인정하고 무기 계약 보장하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거칠었던 건 아니었다. 나는 친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고, 학창 시절 대단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총명하다는 말을 듣던 모범생이었고, 성장해서는 교통 법규조차 함부로 어기지 않는 시민이 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싹싹하게 웃으며 일했고, 어른들 명절 선물 챙기기에도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에게조차 소홀하게 되어 핀잔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비겁한 놈에게 온 마음을 쏟았다. 누군가는 나에게 혹시 '착한 여자 콤플렉스' 아니냐고 말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참고 살았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상황을 면해 보려 했다. '부당하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처지가 못 되었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다. 설마 했는데 나를 데리고 살던 이놈은 애초부터 나랑 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나 혼자 헛꿈을 꾸었음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민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날까 봐 조마조마하며 눈치 보고 살던 습관은 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 놓았다.

▲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4년마다 거듭 해고를 당하며 일하는 비정규직 교사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다. 지난 8월 대전고등법원은 4년을 근무하고 해고된 영전강이 사실상 무기 계약이라고 판결하였으며, 학교장과 계약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전강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임을 인정하여 무기 계약 전환과 고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 바꿀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영전강 제도를 만들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영어 지도안 작성과 영어 수업 시연, 영어 면접 등을 거쳐 6200여 명의 영전강을 선발하여 초중고교로 배치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2조에 영전강의 근무 기간이 4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해고를 반복하는 꼼수를 썼다. 그동안 절반 정도가 일터를 떠나 현재는 3200여 명 남았다.
공개 채용을 거쳐 8년간의 실무를 통해 검증받은 영전강들에게 임용고시를 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이 자격을 인정했음에도 최상위의 기준을 다시 정해 무한 경쟁에 밀어 넣는 논리는 아이들이 경쟁 교육에서 마주하는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전강이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모두가 합격한다 해도 교육부의 생각이 이렇다면 학교는 계속하여 해고하기 쉬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정규직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다시 이 비루한 일자리를 메울 것이다.
머지않아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마구 쏟아 내는 화풀이 식 댓글과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라는 희망 고문에 상처받고 주눅 들어 한없이 우울해졌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고사하고 8년간 15만 원 오른 월급에도 불평 없이 방학에도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무자격자라고 흠을 잡으려 든다. 그들의 주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도리도 필요 없고, 오로지 살자고 발버둥치는 생존 본능의 처절함마저 느껴진다. 가난한 비정규직이 넘쳐 나는 한 이런 진흙탕 싸움은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겪고 지켜본 해고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 살인이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다 걸기 때문이다. 한 영전강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는 것에 저항하여 학교와 말싸움을 벌이다 태아를 잃기도 했다. 교수나 박사님의 해고 또한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나 해고의 위협은 사람의 마음을 하릴없이 좀먹게 만든다.
교원 임용 선발 인원을 깎아 먹는다고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잔인한 왕정의 노예들도 태어날 귀한 신분(정규직)의 앞길을 위해 먼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수년 전 영전강 제도 폐지 서명 용지가 내가 앉은 책상 옆에서 돌던 날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느 집단이나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온 힘을 다해 굴려 내고 싶은 역사의 수레바퀴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 밑에 깔려 다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냈던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을 돌려주겠다던 모 의원님은 줏대가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전강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었다는 말이 옳다. 수년 전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 때 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는 영전강에 대한 댓글로 다운될 지경이었다. 합법적인 후원금조차 낼 수 없게 되자, 내가 어쩌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8년의 학교생활에서 나는 비굴함과 겸손의 차이를 아직 모른다. 나는 아이들에게 겸손하기 위해 비굴함을 선택했다. 어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학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풀 죽어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냥 들여다보였다. 나는 아이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교육학에서보다 한없이 내 몸을 낮추어야 했던 비정규직 생활에서 더 많이 배웠다.
나는 '교사'라는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 일하던 대로 일하도록 고용 안정만 바랄 뿐이다. 내가 만약 학교가 아닌 다른 공공 기관에서 2년을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 계약 대상이 된다. 공공 기관과 학교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 곳인가. 가르치는 일이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혹독한 전문성이 요구되는가. 9년이 아니고 90년을 일하면 인정해 줄 것인가.
추석 명절을 지내며 여성과 비정규직의 삶은 서로 많이도 닮았음을 느낀다. 함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언제나 남에게 해석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는 착하지 않아, 능력이 부족해'라고 끝없이 죄책감을 강요받는다. "임용고시 합격하여 떳떳하게 일하라"라는 말은 영전강의 생각은 들어볼 것 없이 너희는 부정한 집단이라는 누군가의 일방적 해석이다. 짜장면집 주방장이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반드시 세계적 요리사가 되라고 윽박지르는 꼰대의 모습이다. 어느 한 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고 이익을 누리는 쪽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하여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아무리 말단의 일이라도 해고될 걱정 없이 소신껏 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민주주의고 뭐고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하여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강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눈물을 팔아 우리가 옳다고 누구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나를 지지하며 수고를 인정하고 내 노동의 법적 권리가 옳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마치고 밤샘 농성을 하기도 하고 광화문 땡볕 아래서, 교육청에서 싸움을 이어간다. 거기엔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공감도 있어 견딜 만하다. 오늘은 교육부 높은 담장을 향해 소리친다.
"사실혼 인정하고 무기 계약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