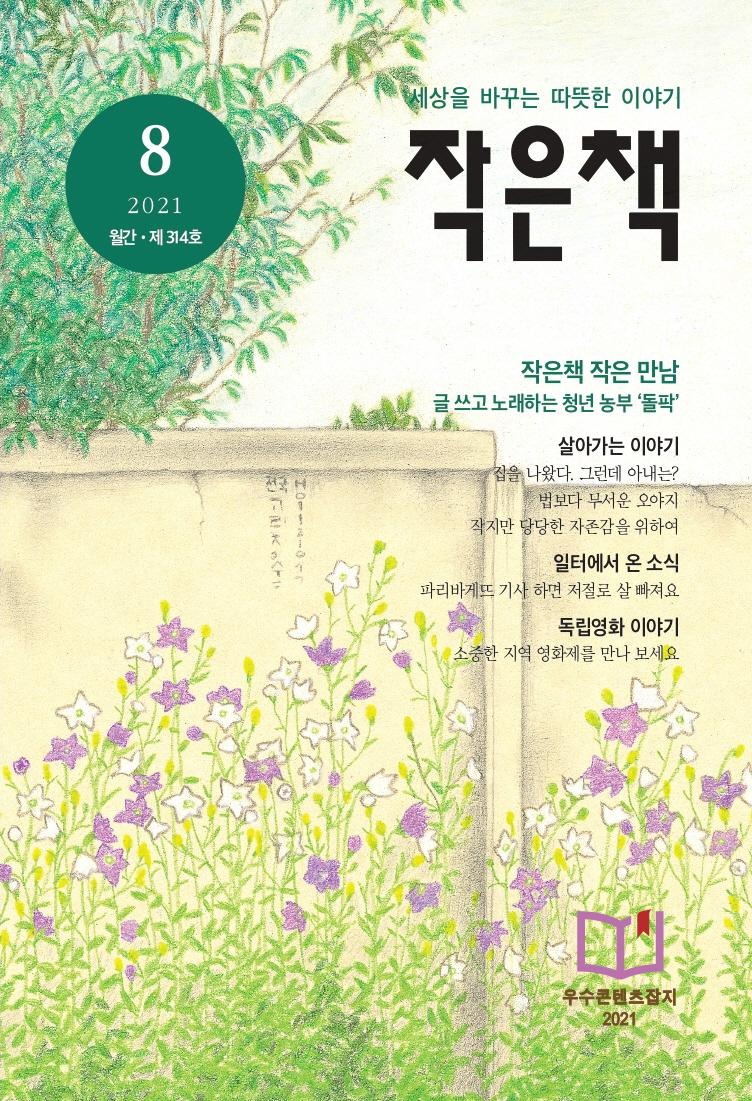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왜 내가 긴장하는 거지?’
중학교 1학년인 작은딸 지인이가 2학기를 맞았다. 개학을 하루 앞둔 날, 왜 내 맘이 이렇게 답답해지는 걸까 생각했다. 아마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담임이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싫은 맘 때문이지 싶다.
지난 3월, 작은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큰딸 지윤이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인이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비밀이야.”
작은딸이 제 언니한테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한다. 자기가 하기 싫은 CA(특별활동)를 친구가 대신 신청을 했기에 담임 선생에게 다른 반으로 옮겨 달라고 했다는 거다.
CA를 시작한 첫 주엔 아이들이 반이 맘에 안 들면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또래도우미반’에서 ‘악기연주반’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 왈, “너 ‘악기연주반’ 그런데 가면 날라리 돼!” 그러면서 안 바꿔 줬다고 속상해했단다. 또 하루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갔는데, 머리가 마르지 않아서 긴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이 딸아이를 보더니 “너 한 번만 더 머리 푼 거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릴 거야.” 그러더란다. 다른 아이들도 머리 풀고 있는 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말이다.
“엄마, 그래서 지인이가 학교 다니기 싫대.”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학교에 흥미를 잃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지윤이가 덧붙인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 안 그래도 엄마가 대안학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일반 학교 선택한 건데 어떻게 말해.’ 그러는 거야.”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지간하면 학교에 찾아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한테 “죽여 버릴 거야” 하고 말한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부모 총회 하는 날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엘 갔다.
딸아이 책상을 찾아 앉아 있으니 학급 대표 아이가 학부모 총회 참가자 출석 체크를 한다. 아이 이름 옆에 엄마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도 적는다. 긴 머리를 풀고 있다. 내 딸의 CA를 제 맘대로 신청한 바로 그 애다. 자기 엄마가 하라고 했다는 CA를 혼자 하기 싫어서 자기가 내 딸아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신청해 버렸다는 거다. 그 애 엄마는 ‘또래도우미반’이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아,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뭐 그런 에미가 다 있냐. 봉사는 점수 따려고 하는 것도,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내 딸들은 어려서부터 두루두루 단체 활동, 캠프 활동 등을 하면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런데 일부러 점수 따게 하려고 수업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이 아니라 봉사 점수 따는 CA를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딸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악기연주반’에 가면 “너 날라리 돼!”라고 말로 폭력을 썼단 말이야?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담임이 학급 지도 방안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 딸 얘기를 한다.
“우리 반에 지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
“선생님, 제가 지인이 엄맙니다.”
“아, 그래요. 지인이 어머니… …. 지인이가 머리에 신경 쓰고, 교복 치마 줄여 입고, 그러다간 화장도 하게 될 거고, 화장한 뒤엔 또 더한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지인이가 사춘기라서 그럴 거예요. 애가 다른 애들보다 성숙해서 사춘기가 빨리 왔나 봐요.”
기가 막혀서!!!
“선생님, 제 딸 교복 치마 줄여 입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제 몸에 맞는 걸 사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어느 회사 꺼요?”
헐~. 애 엄마가 그렇다면 믿어야지 그걸 또 회사까지 확인하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큰딸이 제 동생과 교복을 샀던 거라 혹시나 싶어서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 지인이 교복 치마 줄였니? 어느 회사 꺼니?”
큰딸한테 바로 답이 왔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엘리트 꺼야! 엄마 요새 교복 치마 다 짧게 나와. 그리구 지인이가 다리가 길어서 치마가 짧아 보이는 거야.”
다른 날 같으면 깔깔대며 ‘다리 길어 좋겠다, 너 잘났다’고 했을 텐데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다. 큰딸과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담임은 계속해서 아이들 교복 얘기, 머리 얘기, 사춘기 얘기를 한다.
“선생님, 교복은 엘리트 꺼구요, 교복을 사 준 지인이 언니가 치마를 줄인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줄이지 않았다면 애가 치마 허리를 둘둘 말아 입고 다니는지.”
아! 기가 막힌다. 어이없다. 처음 보는 학급 엄마들 앞에서 아이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담임한테 뭐라고 한마디 날려야 하는데… …. 참, 오늘 내가 찾아온 것은 담임이 우리 애한테 ‘죽여 버리겠다’고 한 말 때문이었는데, 아이 머리, 교복 치마 운운한 것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정작 찾아 온 얘기는 까먹고 말았다. 아, 정말 분해서 돌겠다. 설령 치마를 줄여 입었다고 치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이가 머리에 신경 쓰는 게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라고? 화장하고 더한 것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비약해서 아이를 문제아처럼 몰아가는 담임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니. 말할 기회가 없다. 보고 있는 엄마들도 많은데… ….
담임이 계속 얘기를 한다. 자기는 교사가 천직이란다. 아버지도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셨다고, 자기 집은 교육자 집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오랫동안 생활지도부장을 해서 아이들을 잘 다룬다고 한다. 헉! 애들이 물건이냐? 잘 다루게?
“아이들이 나를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그러냐? 근데 왜 내 딸과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담임이 계속 말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성적이 고3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봐 와서 다 알아요. 애들 모습만 딱 봐도 그 애가 몇 점짜리 애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선생 말대로라면 애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대학 입학 선발도 중 1때 시험 한 번만 보고 미리 뽑아도 되니까 말이다. 이미 앞날이 보인다면서 왜 애들을 6년 동안 그렇게 들들 볶아 드시는가 말이다.
회사엔 오전만 쉰다고 하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거라, 총회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나와야 했다.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필요한 학부모 인원 동원에 몇 개 신청을 했다. 인원 배치가 다 돼야 총회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학교 급식 검수’, ‘학부모 시험 감독’ 두 가지를 신청했다.
“선생님,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웃음, 구겨진 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한 눈빛을 보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꾸벅 인사하고 돌아 나왔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뭐 저런 선생이 다 있냐. 애들을 물건 다루듯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와 엄마 말을 믿지도 않고, 아이의 앞날을 단정 짓고!
회사에 들어가는 길,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고 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했다. 저런 선생에게 배울 게 뭐 있겠나 싶었다. 언젠가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났다. “교사는 안정된 직장인이 아니라,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 저 담임은 학교가 ‘직장’이고, 선생이 아닌 ‘직장인’이다. 문제의식도 없고, 교사로서 성찰도 없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 편하게 보내고 싶은 ‘아이들 관리자’인 거다. 저 선생한테 참교육을 기대하지 말자.
그날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 애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보고 결단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작은딸이 이런다.
“엄마, 그 선생님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화분 담당하는 아이한테는 ‘화분에 꽃잎 하나 떨어질 때마다 너 손가락 하나씩 부러질 줄 알아.’ 그러는 거야. 그치만 1년 뒤에 운이 좋으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는데… …. 지금 막 친구들 사귀고 있는데… …. 나 학교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그냥 견뎌 볼게. 엄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에고, 얼마나 맘이 짠하고 속이 에리던지… …. 학교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고작 해 줄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였다.
“껀수 잡히지 마라. 복장, 수업 태도, 준비물 같은 거,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긴장하고 학교에 다녀서야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나!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 버리자고 작정이나 한 듯이 아이는 여름방학을 신나게 재미나게 놀며 보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대중음악 캠프’에 참가한 딸은, 열흘 동안 왕복 네 시간 걸리는 길도 전혀 힘든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다녔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딸아이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대중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여긴다. 딸아이를 보며 ‘노는 것도 공부’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는다. 부천까지 두 시간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걸으며 길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배운 것들,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음악 전문가들 모두가 딸아이에겐 고마운 스승이다.
방학이 끝나고 나니 아이는 부쩍 자라 있었다. 비록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한 개도 외우지 않고 방학을 보냈지만… …. 아니다! 딸아인 오디션 때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캠프 내내 자신이 선곡한 마이클 잭슨의 ‘벤’을 연습하고 녹음하며 영어 공부를 했다! ㅎㅎ.
개학 전 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딸에게 말했다.
“지난 한 학기 잘 견뎠지? 얼마 안 남았어. 네 말대로 ‘운이 좋으면’ 내년엔 좋은 담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지내 보자. 뭐? 숙제 안 한 게 있어? 빨리 해,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