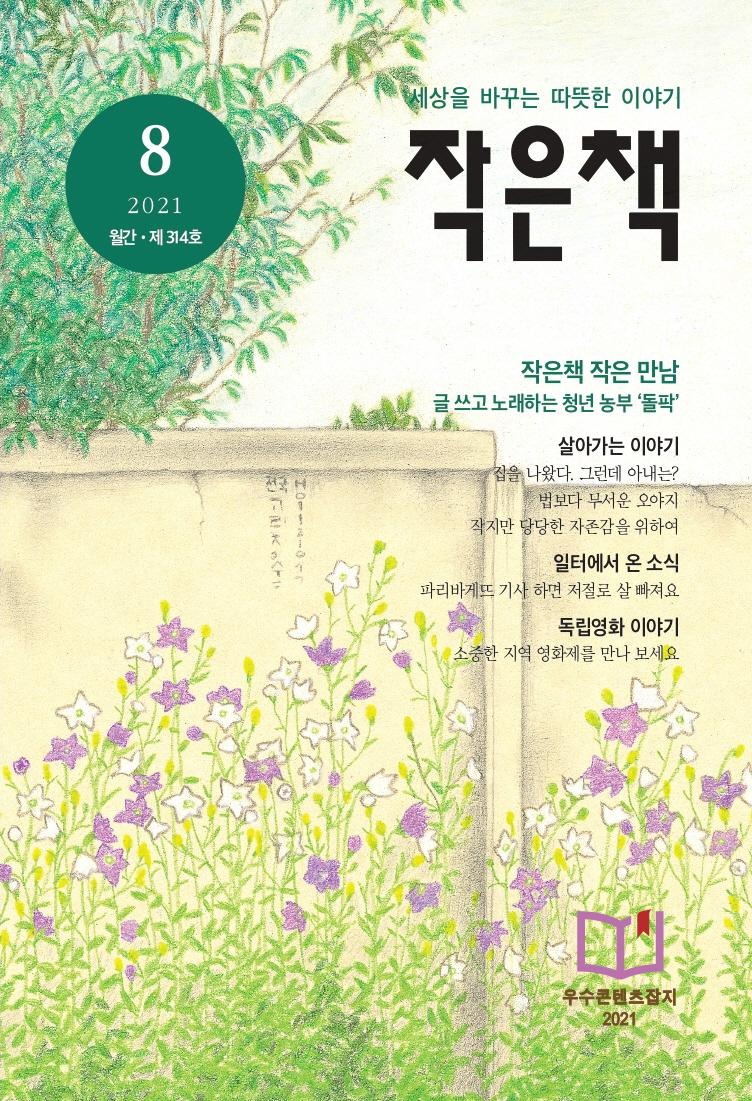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5주년 특집_ <작은책> 독자 25명에게 물었다.
“요즘 뭐해 먹고삽니까?”
“온라인 개학이면 점심도 온라인으로 나오냐?”
안미선/ 작가
내일이면 이사를 한다. 묵은 살림을 정리하니 쓸데없는 것을 많이도 끼고 살았구나 싶다. 버릴 건 버려 널찍해진 베란다를 보며, 화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뒤늦게 생각한다. 비우지 못해 새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건 집이나 마음이나 같다. 이사 갈 집은 지금 집보다 좁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도 많이 처분했다. 하지만 몇 장 끄적이다 만 일기장을 뒤적이기도 하고, 오래된 노동자협회 소식지를 넘겨 보기도 한다. 망설이다가 그건 가져가기로 한다.
앨범은 들춰 보다가 괜히 보았다 싶다. 헤어진 사람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때는 좋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결혼식 때 내 얼굴을 보니 곱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더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피부염을 앓은 아이의 얼굴에 새삼 안타까워하고, 갓 목욕한 아기의 맨살에서 살 냄새를 떠올리기도 한다. 오래전에 쓴 글을 읽을 때처럼 기쁨과 슬픔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지난 일은 다 잊었다고 여겼는데 묵은 상처만 들쑤신 것 같다.
나는 스무 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그동안 이사를 여덟 번 했다. 학교를 다닌다고, 취업을 했다고, 결혼을 했다고 다른 동네를 전전했다. 보통 몇 년씩만 살다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에서는 8년째 살았다. 가장 오래 산 집이다. 그래서 셋집인데도 정이 들었다. 이 집에 이사 올 때 아이는 취학 전이었다. 이 집에서 초등학교 6년 시간을 보냈고,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갔다. 〈작은책〉에 ‘아기 낳는 날’이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 아기가 열다섯 살이 되었다. 엄마로서 절반의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아이가 좀 더 자랐으니, 이제 내 일도 찾고 돈도 벌어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글을 쓰고 살고 싶었다.
책꽂이가 둘러싼 작은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글을 썼다. 강의가 있다면 달려갔고, 예술인 지원사업에도 참여했다. 아이는 쑥쑥 자라고 난 앞만 보고 달렸다. 이젠 책도 몇 권 펴냈고 글을 써서 산다는 이름을 그런대로 달 수 있게 되었다. 이 집에서 나는 작가가 되었다. 물론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나는 집에서 주로 일한다. 식사를 차리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전화며 택배를 받으면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 다른 많은 여성들도 그렇겠지. 떠맡겨진 가사와 육아일을 해내고, 일도 척척 해치우기 위해 피나게 발버둥을 칠 것이다. 때로 엄마가 되었다가 작가가 되었다가,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순간순간 역할을 바꾸게 되지만, 나를 지켜 내고, 아이를 지켜 내고, 내 일을 지켜 내었다.
내가 글을 쓸 때, 아이는 심심하다고 소리쳐 나를 불렀다. 엄마 없다고 느닷없이 울기도 했다. 저녁에 강의를 할 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이웃집을 전전했다. 연말이면 몰려오는 피로와 압박에 소리를 꽥 지를 때도 있었다. 생일날, 약속 하나 없다고 내가 징징대자, 보다 못한 아이가 용돈으로 케이크를 사 와서 같이 즐겁게 박수쳤다.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었다. 모든 악다구니와 웃음과 부대낌이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 분주한 손을 놓고 집을 물끄러미 보게 된다. 기억은 이렇게 생생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자리는 상상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의 방학은 길어졌다. “내 인생에 이런 때가 또 있을까?” 학교에 안 가는 게 마냥 좋은 아이는 알사탕을 문 것처럼 즐거워한다. “온라인 개학이면 점심도 온라인으로 나오냐?” 내가 쏘아붙이자 아이가 놀란 표정이다. 난 입을 꾹 다문다. 집에 있어도 엄마가 일을 해야 하고 들어오는 수입이 줄고 지출은 많아져 골치를 앓는다는 걸 아이는 모른다. 그래, 몰라도 된다. 그냥 농담으로 맞장구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집안의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까, 일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배경처럼 취급되는 게 불편하다. 이러니까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를 계속 써 내야 할 것 같다.
〈작은책〉이 스물다섯 살이 되었다. 나는 스물다섯 살에 무얼 했던가 생각해 봤다. 글을 쓰고 살겠다고 결심했고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작은책〉은 그때 운 좋게 만난 친구였다. 글쓰기 모임에도 갔다. ‘정직하고 소박한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의 길을 따라갔다. 실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꿈꾸었는데, 그건 다른 길이었다. 난 그 샛길로 들어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다. 내 이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들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고 쓸 수 있다’는 〈작은책〉의 가르침을 잊은 적 없다.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작은책〉은 나에게 말을 들려준 또 다른 당신이기도 했다.
처음 글쓰기 모임에 가서 글을 꾸며 쓰면 안 된다고 구박을 듣던 사회 초년생이 이십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작은 결심을 지켰다. 〈작은책〉은 아프고 억압받는 목소리에 주목하며, 글을 쓰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힘을 믿었다. 글 쓰는 노동자들을 키워 내었다. 스물다섯 해 동안이나 그 약속을 지켰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어렵고 애썼을 것이다. 축하한다, 좀 더 이 길을 가 달라고 친구로서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