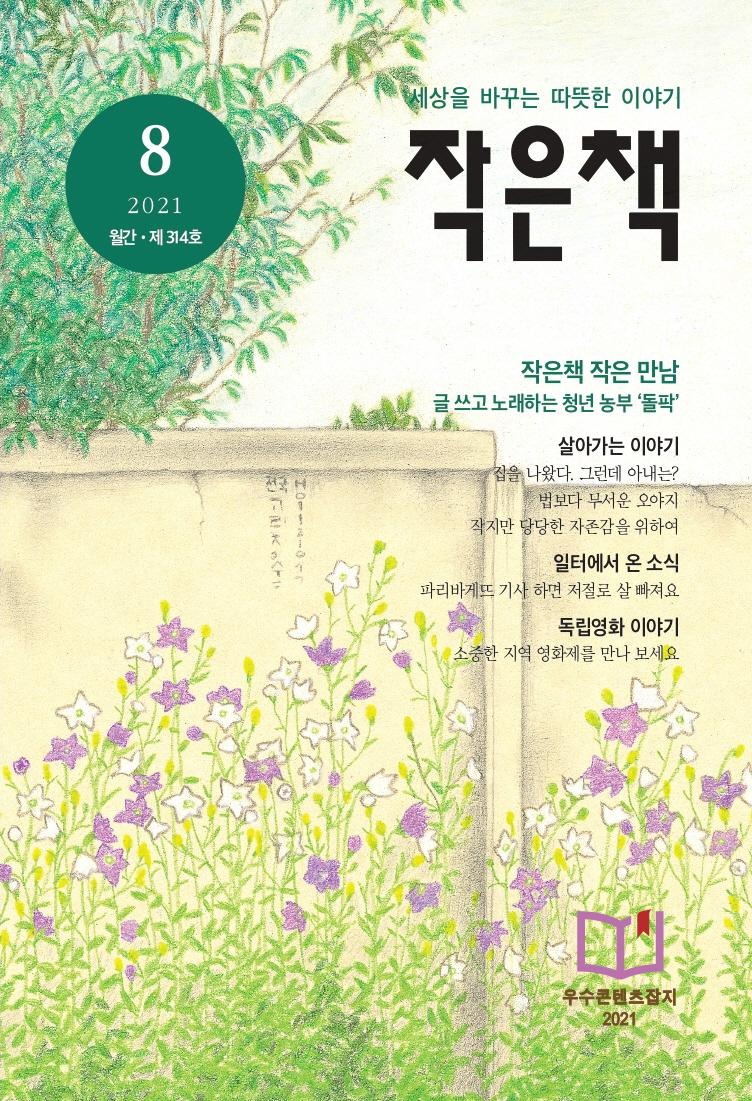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20년 1월호
살아가는 이야기
배울 권리, 살아갈 권리
최숙하/ 장애인 재택근무 사원
나는 스물아홉 살,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어머니는 임신 7개월에 나를 낳았다.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만이 시작되었고, 배 속 태아는 거꾸로 있는 둔위 상태였다. 산모도 태아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 때문이었는지, 나는 1.25키로그램의 미숙아로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보았다.
첫돌이 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내가 비장애인으로 살 수 있었던 전부였다. 아무도 나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시간이기도 했다. 돌이 지나도 나는 제대로 서지도, 걸음마를 떼지도 못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뇌성마비였다. 지적 발달은 6세쯤에서 멈출 것이고, 걷지 못할 것이고, 전형적인 강직 증상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나의 지적인 능력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성장했지만, 몸은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과 달랐다. 서거나 걷는 것은 물론이고 벽에 기대지 않으면 앉을 수조차 없었다. 몸의 강직 때문에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었고 말도 어눌했다. 아홉 살이 되어 겨우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은 텔레비전과 비디오테이프와 동화 테이프가 전부였다. 부모님은 할머니에게 나를 맡겨 놓고 일을 하러 나갔다. 나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일곱 살이 되던 해 취학통지서가 나왔지만, 입학할 학교의 교장은 나의 장애 상태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도 몸이 불편한 나의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지적인 능력은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능숙하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쓸 수는 있었지만, 결국 나는 초등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후, 재활 과정을 거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는 아홉 살이었다. 비록 시설 안에서뿐이었지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었고 현장학습을 통해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홉 살의 나는 점심과 간식을 먹거나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거나 억지로 낮잠을 자야 하는 유치원생 수준의 생활을 해야 했다. 장애의 정도도 나이도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나에게 맞는 교육도 어울릴 친구도 없었다.
일 년이 지나고 열 살이 되어서야, 한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장애인 재택학급’이 생겼고, 나는 비로소 초등학생이 되었다. 학교 소속의 특수교사 한 명이 시설로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었는데, 몸 상태와 지적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선생님 한 명이 일대일 개인 지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을 다 배우지도 못했다. 수학과 국어가 수업의 전부였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역시 한쪽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야 했다. 보조교사가 한두 명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나는 초등학교 과정 6년을 결핍과 무기력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열여섯 살이 돼서야 시설과 재택학급을 떠나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다니는 장애인 특수학교 중학부에 입학했다. 등하교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은 그곳 기숙사에서 고등부 과정까지 6년을 지냈다. 나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스스로 생활해야 했다. 목욕, 청소, 옷 갈아입기, 휠체어 타기…. 내 몸 상태로는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없었다. 우왕좌왕하다가 수업에 지각하고 꾸중을 듣고 함께 생활하는 방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일쑤였다. 생리대를 갈지 못한 날에는 수업이 끝날 때쯤 교실로 들어가기도 했고, 휠체어를 잘 움직이지 못해 이동수업 때마다 헤매 다녀야 했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면서 어린 시절의 갸름하고 제법 예쁘장했던 내 모습은 사라졌고 친구들은 그런 나를 놀려 대기도 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울며 잠들었다.
마침내 중·고등 과정 6년이 지나고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칭찬을 받은 것은 글쓰기였다. 그것은 몸이 불편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뻤다.
나는 국문과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이었다. 그들과 같은 수업을 들었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초·중·고 시절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전공 과목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똑같이 주어진 시험 시간 동안 불편한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나에게는 무리였다. 글씨는 엉망이었고 성적도 과락을 겨우 면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학교 안에는 휠체어로는 갈 수 없는 곳도 있어서 가장 맛있는 학식은 한 번도 먹을 수 없었다.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 도구로 가득 차 종종 다른 화장실을 찾아다녀야 했다.
‘장애학생회’와 함께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등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내 보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장애인의 세상도 비장애인의 세상도 ‘바깥’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헌법 제31조 1항을 알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배울 권리, 살아갈 권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배움에 목마르고, 갈 수 없는 곳은 더 늘어만 간다.
“특수반에서 수업이라고 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사운드북 몇 번 눌러 주는데 사운드북은 집에도 많아요. 원반(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성은이는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큰 교육이 된다’는데, 이게 공부인가요? 성은이는 손만 빨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갔더니 손만 얼마나 빨며 침 흘렸는지, 바지까지 젖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은이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심심하고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비마이너>, ‘휠체어 타는 우리 아이는요?’(2019년 3월 13일) 인터뷰 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