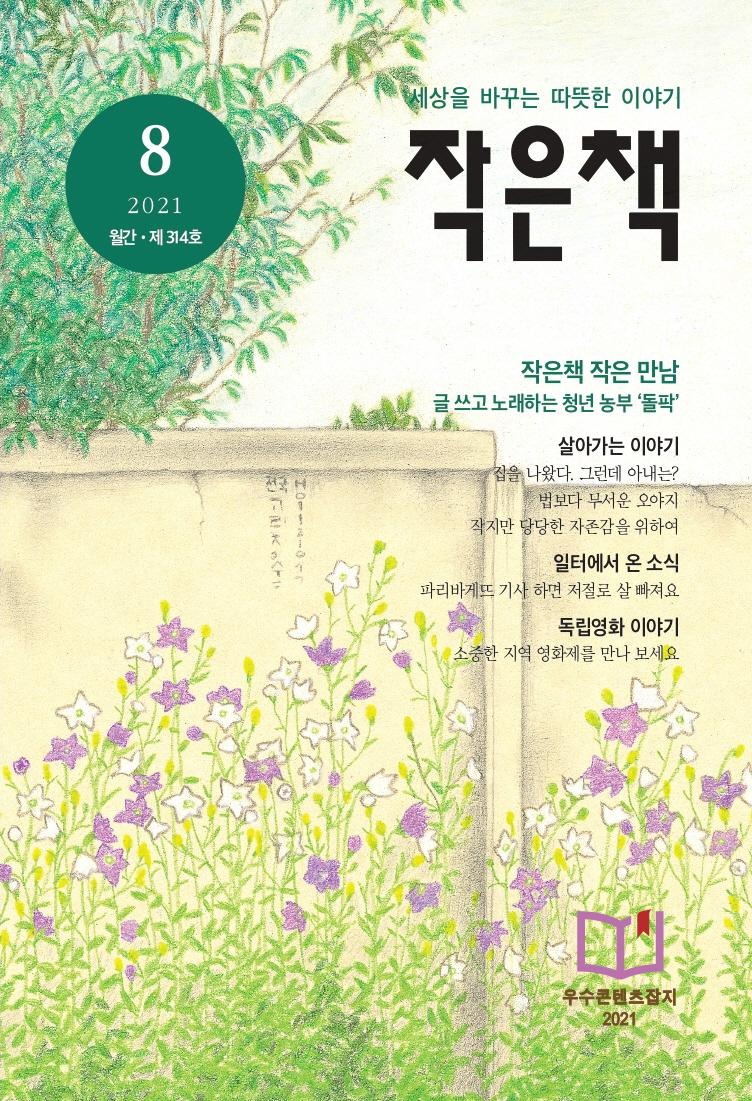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19년 9월호
교실 이야기
똥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곽노근/ 고양 상탄초등학교 교사
아침을 거른 적은 없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장은 튼튼하고 건강해져 일을 열심히 잘한다. 아침을 거른다면,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불편해 오전 중에 꼭 일을 치르게 된다. 쉬는 시간에, 틈을 봐서 허겁지겁 5분 정도 만에 끝내야 한다. 나는 진득하게 오래 누는 버릇이라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너무 버겁다. 하지만 허겁지겁, 되는 만큼 후다닥, 마무리하고 나온다. 아무리 내 똥이 급해도, 수업은 해야 하지 않은가. 급한 불은 껐으니.
첫 문단과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 똥 얘기다. 나는 똥 얘기 하는 걸 좋아한다. 사실 똥 얘기, 더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어릴 때는 똥을 지금처럼 잘 누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눴던 이야기,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하루에 다섯 번 넘게 누기도 했던 이야기 등등. 그러나 이 자리가 내 똥 눈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치련다. 여하튼 나는 똥 얘기 하는 걸 좋아한다. 똥 얘기는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 주니까. 더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을 천진하게 웃게 해 주니까. 금기의 아슬아슬한 영역을 똥이 건드려, 시원하게 해 주니까.
그렇다고 무슨 내가 똥 얘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똥 얘기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당연히 애초에 꺼내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혹은 똥 얘기 꺼내면 감정의 벽이 확 무너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꺼낸다. 그마저도 수줍은 나의 성격 탓에 상황을 보고 또 본 후, 내 몸이 시킬 때 꺼낸다. 벌써 똥 얘기만 세 문단째다.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넘기시길 권한다. 앞으로도 계속 똥 얘기만 할 것이므로.
학교에서도 물론 나는 아이들에게 똥 얘기를 한다. 어른들에게 똥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에겐 상대적으로 덜하다. 아이들은 백이면 백 좋아한다. “똥” 단어만 나와도 아주 자지러지고 죽을려 그런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을 두고 내 어찌 똥 얘길 안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과 똥 얘기는 일상이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응, 똥 싸러.”
“(까르르 웃으며) 또 똥 싸러 가세요?”
“응, 당연하지!”
“(또 배시시 웃으며) 선생님, 즐똥하세요!”
“그래, 고마워. 즐똥할게!”
급식실에서 급식을 마치고 나오면, 언제나 나를 맞아 주는 네 명 정도의 4학년 우리 반 여자 아이들이 있다. 나를 졸졸졸 따라온다. 그러면 나도 뒤돌아 그 아이들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른다. 교사용 화장실. 위 대화는 그 내가 화장실을 가기 전 이 아이들과 항상, 매일 주고받는 대화다. 물론 실제 점심시간에 교사용 화장실에서 똥을 누진 않는다. (물론 아주 가끔은….) 그저 소변보고, 손을 닦고 할 뿐이다. 그러나 저렇게 똥 얘기를 농담 삼아 섞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유쾌한가.
그 유쾌함을 위해 다소 도발적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전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급식을 했는데, 밥 먹는 동안 플래시 노래를 많이 틀어 줬다. 이번엔 어떤 노래를 틀까 목록을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꽂힌 제목이 있었다. 바로 ‘내 똥꼬’. “선생님, 저거 틀어요!”라는 말을 나는 놓치지 않고 잡아챘다.
내 똥꼬 _ 박진하 시/ 백창우 곡
똥 누러 뒷간에 가면
똥은 뿌지직 잘도 나온다
끙 끙 끄 응
조금만 힘줘도 잘도 나온다
자랑스런 내 똥꼬
플래시 영상엔 똥 누는 장면, 똥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또 틀자 해서 또 틀었다. 그래, 원하는 만큼 틀어 주마. 처음엔 재밌어 하던 아이들도 밥 먹으며 똥 노래를 계속 보고 들으니 거북했는지, 몇몇 아이들은 고만 보자 한다. 그렇지만 장난기 많은 친구들 몇몇은 또 보자 한다. 그래서 꿋꿋이 또 틀었다. 힘든 아이들이 늘어 갔다. 너무했나. 그러나 나는 간사하게 속으로 낄낄대며 웃었다.
그래서 벌을 받았나. 어떤 아이가 똥을 지렸다. 누군지는 모른다. 대변기가 있는 두 번째 칸. 똥은 대변기 뚜껑, 대변기 모서리, 양옆 벽, 벽 뒤 등등 산발적으로 묻어 있었다. 그 아이는 똥으로 그림을 그린 게 틀림없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은 모두 고민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냄새는 심했고, 이 상태로 주말을 맞을 학교를 떠나기엔, 똥의 자태와 냄새가 너무 추악했다. 행정실에 전화해 보니 청소하시는 여사님(학교에서 이 직종에 일하시는 분의 호칭을 고작 ‘여사님’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땅히 더 나은 호칭을 찾지 못해 부끄럽게도 부득이 이 단어를 쓴다.)은 이미 퇴근하신 후였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머리를 맞대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군대 가기 전 발령받은,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전 다시 발령받은, 그 당시 신규였던 승현(가명)샘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제가 치울게요.”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게 뭐 그리 큰일이냐는 듯,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듯. 승현샘은 바로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으며 걸레를 찾아 나섰다. 나도 뒤따라가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으며 걸레를 찾아 나섰다. 이내 화장실에서 호스를 꽂고 두 번째 칸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호스의 물과 걸레로 똥의 그악스러운 자태는 생각보다 금세 사라졌다. 승현샘이 주도적으로 했고, 나는 뒤처리만 살짝 했다. 승현샘 이전엔, 누구도 똥을 직접 닦고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 아이들이 통으로 엎은 반찬 찌끄러기들을 치워야 하고, 속이 안 좋아 게워 낸 아이들의 토를 치워야 하고, 교실에 들어온 벌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지만 똥은 아니었다. 똥을 치우지 않을 만큼은, 고상했다. 그리고 그 정도 고상함을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똥을 직접 닦고 치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욕먹을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왠지 부끄러웠다. 똥을 좋아한다던 내가, 결국 현실의 똥 앞에서 주저하다니. 똥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았다. 글을 쓰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앞으로 똥 얘기를 부끄럼 없이 할 수 있을까. 똥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