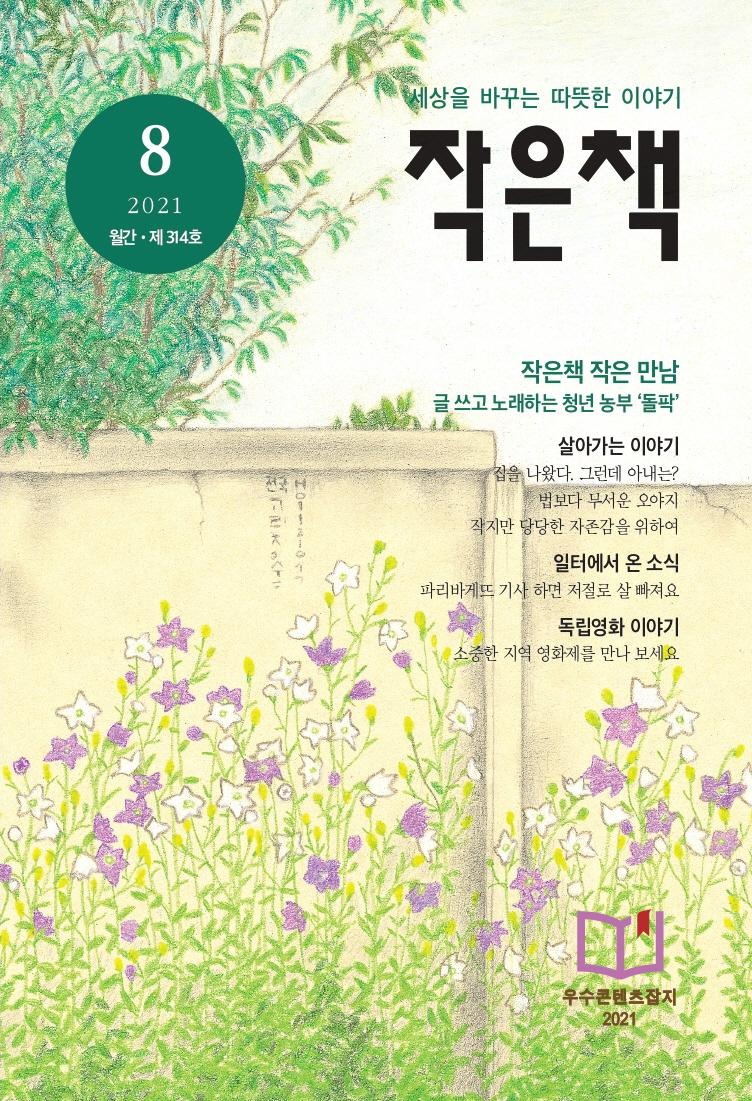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19년 2월호
책이 이끄는 여행
국회 앞 작은 집
글 / 사진_ 하명희
▲ 국회 앞 작은 집 ⓒ작은책(하명희)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를 빠져나와 열한 걸음을 걸으면 3인용 텐트만 한 작은 집이 있다. 이 집의 벽면은 천막이 아니라 조각 천으로 이어져 있다. 왼쪽에는 세 개의 산등에 동이 터 오고, 오른쪽에는 조각배가 떠 있는 바다가 출렁인다. 사면의 조각보 위로 삼각 지붕이 얹혀 있는데 국회의사당 정문 쪽으로 ‘살아남은 아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박음질되어 있다. 그 아래엔 바닷가 해당화일까, 커다란 꽃송이가 피어 있다. 이 집의 삼각 지붕에는 다른 집에는 없는, 매일 숫자가 바뀌는 칠판이 있다. 정문에는 머리를 빡빡 민 아이가 ‘나는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라는 글자가 박힌 붉은 티셔츠를 문패처럼 달고 있다. 그 옆에는 여름에도 이곳에 이 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돌돌 말려 올라간 차양막이 있고 스티로폼으로 된 문이 있다. 문을 열면 방이다.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방. 그러니까 이 작은 집은 방이다. 이 방에 들어와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묘한 기운이 있는데, 그것은 방의 두 면에 있는 산과 바다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서일 것이다. 산의 속, 지하철역 쪽으로는 지난가을에 입었을 법한 쑥색 점퍼가 걸려 있다. 바다의 속, 국회의사당 정면 쪽에는 “형제복지원에는 3개의 병동이 있었다”로 시작되는 어느 날의 신문 기사가 벽면 가득 붙어 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다른 이름 '살아남은 아이' ⓒ작은책(하명희)
앞머리가 눈을 덮고 찬기에 어깨를 웅크린 그가 허리를 구부려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발을 뻗었다. 그가 미리 덥혀 놓은 주전자에서 캔 커피를 꺼냈다.
“이거라도 들고 있으면 조금 나아요.”
이 방에서 캔 커피는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온열기다. 이 이불 하나로 괜찮으냐고 물었다.
“하도 길에서 살아서 이젠 뭐, 괜찮아요.”
그의 입에서 허연 입김이 나왔다. 누구나 들어오라는 듯 입김이 열린 문 쪽으로 빠져나갔다. 누군가 고개를 들이밀고 손님이 있었네, 하고 끼어들었다. 그는 1인시위에서 했다던 몸에 익은 목례를 하며 내게 “저기 민간인 학살 투쟁위원회의 어르신이에요” 하고 말했다. 다른 농성장에서는 천막 안에 잠자는 텐트가 있던데 여긴 온열 기구도 없이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었다.
“천막 농성장이 커지면 더 추워요. 작은 게 좋아요. 여긴 사람들이 신발 벗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든 얘기나 농담이나 그런 걸 나눌 수밖에 없죠. 방이니까. 사랑방이라고 해야 하나.”
그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 그는 칠판에 날짜를 지우고 더하며 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렇게 와 준 것만으로 고맙죠. 저쪽 한국에서 제일 큰 집(국회)에서는 아무도 안 와요. 매일 이 앞을 지나가면서도 단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1인시위를 시작한 때가 2012년이니까 6년 지났고 올해 7년째인데, 작년 12월 26일에도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구요.”
그는 웅크린 어깨가 그대로 굳어 버린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말했다. 나는 책을 보았다고 했다. 내가 책을 꺼내자 그는 첫 페이지를 손으로 짚었다.
“이게 나예요. 팔사일공삼육일팔! 아홉 살 때. 어릴 때 사진은 이것뿐이에요. 팔사일공삼육일칠은 작은누나고.”
그는 이빨이 시린지 얼굴을 찡그렸다. 책을 보고 알고 있었다. 그에게 추위는 공포라는 걸. 잠깐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밥을 나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알아채는 법을 아홉 살 이후 몸에 익힌 듯 내게 먼저 “밥 먹으러 가죠”라고 말했다.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그들 수용소의 생존자들을 이렇게 부른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대략은 알고 있다고 말한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이것이 그들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는가. 그는 밥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빨이 아파서요. 어릴 때니까 유치가 빠지고 어른 이빨이 나오는 때였어요, 형제복지원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가. 그때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빨리 먹어야 하니까 급하게 삼키던 것이 버릇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떻게든 거기서 나가야 사니까 이를 악물었던 게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내가 씹기에는 무른 밥이 그에게는 딱딱한 밥이었구나. 이 책에는 그가 왜 무른 밥을 씹지 못하고 삼켜야 하는지, 왜 찬 바닥에서 자는 것이 일상이면서도 그것이 공포인지, 왜 어깨를 움츠린 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인사를 하는지, 그의 몸에 새겨진 폭력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역사의 거대한 공백’이 조각보의 박음질 글자처럼 새겨져 있다.
▲ 《살아남은 아이-개정판,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전규찬, 박래군, 한종선/ 이리/ 2014)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개나 소나 다 글을 쓰는구먼.’ 그렇다. 한때 나는 개였고 소였다. (…) 사람에서 짐승처럼 되긴 쉽다. 그렇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든다. (…) 나는 지금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한다. (…)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국가가 버렸고, 사회가 관심을 안 갖는데, 어찌 개인의 힘으로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길 원하는가?” ―한종선, 《살아남은 아이》(이리, 2012) 134∼135쪽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옥을 경험한 그가 형제복지원을 나와 생존자로서 살아야 했던 세월을 사회가 몸으로 받아 적는 일이다. 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다. 안영춘은 “어째서 소년은 그동안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수용소와 연관된 모든 이들이 퇴소 후에도 여전히 비가시적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문맥과 행간에서 찾아야 한다”(10쪽)고 이 책의 발문에 적고 있다. 책이 나온 것이 2012년이니 벌써 7년이 지났다. 그사이 이 책의 소년이 던진 질문들은 그 ‘거대한 공백’을 어떻게 채웠을까. 이 책을 기획하고 생존자 한종선이 그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격려한 전규찬은 수용소의 생존자들에게는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의 의무’를, 수용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그 증언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청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수용소에서 살아 나온 책 속의 아이가 있고, 생존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은 423일째 폭력의 날짜를 새기고 지우며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수용소의 생존자들이 진심으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가?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한국에서 가장 큰 집인 국회 앞에 ‘나는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라는 문패를 단 작은 집이 있다. 작은 집에는 울타리가 없어 집 밖이 다 마당이다.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들고 직접 가야 한다. 작은 집은 지나는 사람이 들어와 인사를 건네거나 주변의 농성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풀어놓는 사랑방이 된다. 작은 집 마당의 큰 집에서는 작년에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수용소의 생존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7년, 국회 앞에 작은 집이 들어선 지 423일이 지났다. 그동안 국회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작은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 않았다.
* <작은책> 편집위원인 글쓴이는 2014년 《나무에게서 온 편지》로 제22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