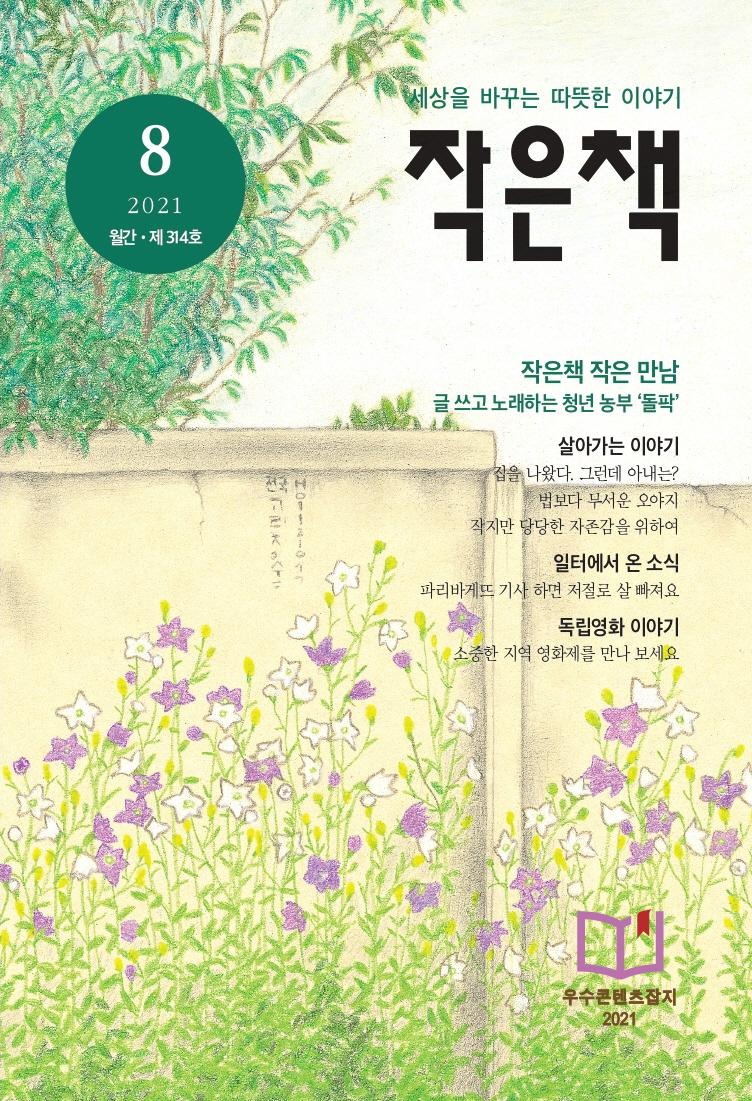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18년 6월호
청년으로 살아가기
강릉으로 힐링하러 온다는 당신에게
진솔아/ 강릉에 살고 있는 청년
“아, 힐링하고 싶어. 나 강릉 가도 돼?”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심심치 않게 받는 카톡이다. 인구 천 만이 넘는 메가시티에 살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강릉은 언제나 심신 치유가 가능한 시골 마을이다. 인구 21만의 도시(2018년 5월 기준) 강릉은 주말이나 연휴엔 관광객들로 넘쳐 나는 곳이 되었다. 이젠 해송을 따라 걸어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한적하게 즐기던 바닷가의 망중한은 없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도심 안에 자동차가 평소보다 훨씬 늘어나고 연휴라도 있는 달에는 사람에 치여 밖에 나갈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의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나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과 창출이 늘어난다? ‘관광’을 달고 있는 도시의 위정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밥 먹듯 반복하는 소리이고 지역 소시민들이 의심 없이 믿는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강릉에서 내가 사랑하는 곳 중에 하나가 경포호수이다(였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석호이자 바다와 닿아 있는 그곳에 서서 대관령의 준엄한 산맥들을 바라보면 강릉에서 나고 자란 최고의 시인 난설헌과 사임당의 한(恨)이 느껴지는 쓸쓸함이 좋았다. 호수 어디를 걷다가도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송을 넘어 동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도 다 지나간 감상이다. 정철이 <관동별곡>에 쓴 경포대가 있는 이곳은 오래도록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해안지역의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로 묶여 있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하에 올림픽특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권한이 쥐어졌다.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행정의 폭풍 지원하에 호텔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고 결국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그 풍경은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전락했다. 호수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시야는 주변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공룡 같은 규모의 흉측한 건물로 꽉 막혔다. 속상한 마음. 나는 내가 사랑했던 호수를 그렇게 잃었다.
서울-강릉 114분! 강릉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아파트 개발업자들의 광고에 꼭 들어가는 말이다. “강릉이 올려다보는 매직 스페이스라이프, 쾌속 교통망, 명당의 자연환경!” 어느 아파트 분양 홍보책자에 쓰여 있다. 요즘 강릉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일까? 아니, 강릉에 지어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아파트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세컨드하우스다. 이런 아파트들이 4~5억을 호가해도 금방 계약이 완료된다. 업자들은 계약금 10퍼센트만 내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버려도 앉아서 수백, 수천은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투기. 말로만 듣던 그 부동산투기의 열풍을 거리의 광고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강릉에서 학자금대출의 빚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 ‘개발’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는 관심이 없고 개발업자들과 골프를 함께 치며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을 것이다. 옆 동네 속초 역시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투쟁 산행에 갔다가 봤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들.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주민등록 인구가 겨우 8만 명 정도 되는 속초 시민들을 위한 행정일까? 속초는 지난겨울 단수까지 겪었다. 가뭄도 가뭄이었겠지만 갑자기 늘어난 객식구들을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이리라.
이런 일련의 변화로 나와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집값이 오른다. 물가도 오른다. 자주 가는 사랑하는 가게들과 공간을 잃는다. 그래도 자꾸자꾸 개발이 된다. 어릴 때부터 품어 온 추억이 있는 장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탈바꿈한다. 돌아가신 아빠와의 추억이 많은 호수의 풍경을 잃었고 교통체증을 얻었다. 물론, 어떤 가게 자영업자들은 신이 날 것이다. 서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가게들도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유입되는 외부 인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가장 많은 것이 ‘관광개발’이다. 개발을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민간사업자들이다. 나는 진심으로 강릉이 그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개발 속에서 지역에서 생겨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생기는 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다. 아파트 분양 홍보관 같은 데서 일을 하거나 카페나 식당의 시간제 일자리 또는 리조트 청소 같은 계절적 업무들이 생겨난다. 나 역시 여름방학마다 바닷가의 고급 리조트에서 객실 청소를 했다. 물론, 모두 비정규직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기엔 불안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힐링하러 오겠다던 서울 친구들은 불편해한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가서 돈을 많이 쓰면 어쨌거나 지역에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왜 이게 돈을 많이 내고 가니 그만 툴툴거리라는 말로 비꼬아 들릴까. 당신은 돈만 내고 가지 않는다. 쓰레기도 두고 가고, 교통체증도 두고 가고, 고성방가도 두고 간다. 관광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경제 훈풍을 타 보겠다고 더 많은 개발 사업들을 구상 중이다. 정동진의 곤돌라 사업, 중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강릉의 해안가를 따라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나와 친구들에게는 모두 끔찍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