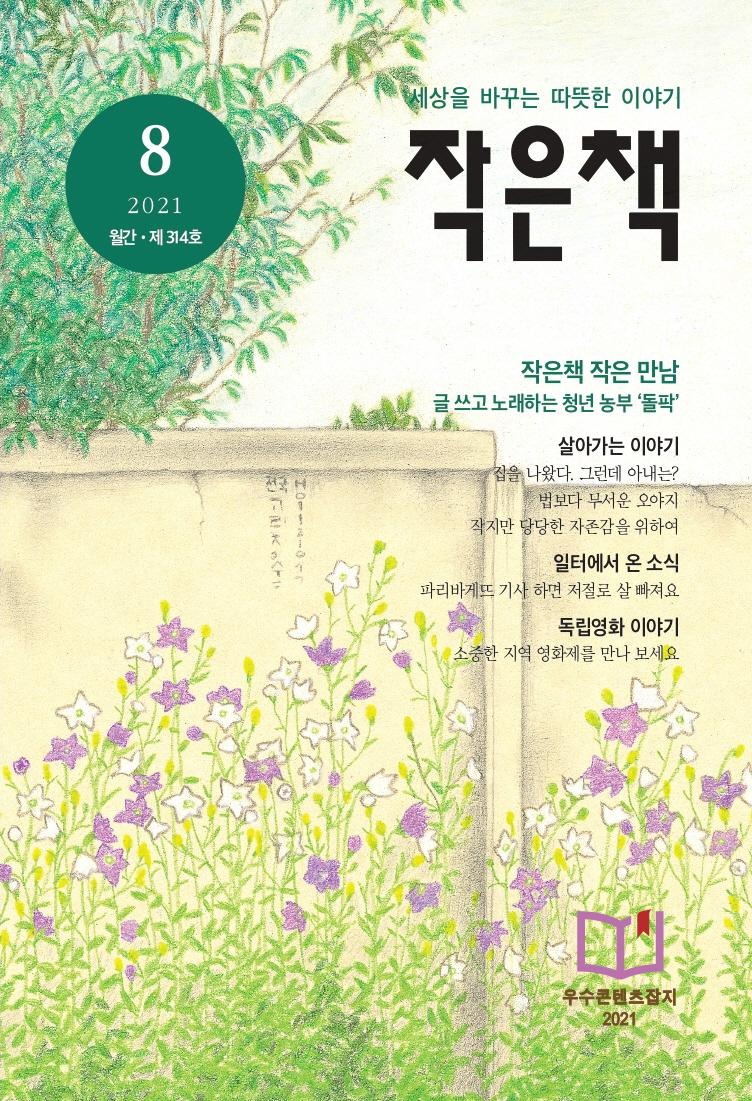<작은책> 2019년 12월호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18)
이만큼 했으면 다 한 거지 뭐!
송추향/ 한사람연구소 소장
오늘 딸아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라니! 써 놓고 보니 더 낯섭니다.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본인뿐 아니라 학부모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도 봐야 하는 곳입니다. 면접에 임한 선생님들이 어찌나 푸근한지 하마터면 퍼질러 앉아서 푸념을 늘어놓을 뻔했습니다. 들어갈 때 사교육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고마운 학교라서 꼭 붙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소서에 면접까지 마치고 나니, 할 일을 다한 기분입니다.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떨어져도 이제부터는 뭐 자기 인생이지요.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입시 준비 따위 말고 정말 ‘배움’이 있는 공부 시키고 싶어서 부린 욕심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키우는 동안 아이는 내게 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갓난쟁이일 때는 젖 물리고 똥오줌 닦아 주며 생존시키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도전이었지요. 제 발로 걷고 밥 먹고 할 때부터는 먹고사는 일, 집안 살림,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것이 도전 과제였습니다.
이 ‘미션’을 ‘클리어’해 가면서 ‘레벨 업’ 되었던 시간을 가만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될 여력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내 경우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그리고 방학이라는, 어쩔 수 없는 ‘엄마 부재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늘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딸아이 말마따나,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니까, 민폐를 끼치고 은혜를 갚고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떤 때는 끼친 폐가 많아 약소한 은혜 갚음으로는 갚아지지 않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작은 민폐에 너무 많은 죄책감으로 자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균형이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마는, 덕분에 혼자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고, 뜨겁고 진한 관계망들이 도처에 생긴 것 같습니다.
딸아이 레벨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첫째로, 아기 때는 어린이집에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신세다 보니 감기며 중이염이며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감기 한번 심하게 앓지 않으니 몸이 많이 좋아졌지요. 둘째로, 터진 입으로 못하는 말이 없고, 튀어 오르기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다가 말도 제법 가려 하게 되고, 문도 살살 닫고, 화도 덜 내고, 급기야 좋은 마음이 들 때는 좋은 이야기를 꺼내 놓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한번 구기면 너덜너덜해지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생긴 모습 그대로 다시 튀어 오르는 용수철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레벨 업 되는 과정을 쓰다 보니 어느새 이번이 마지막 연재 글입니다.
내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몇 날 며칠은 떠들 수 있지, 책이 몇 권은 나오지 싶었는데, 실은 <작은책>에 한두 번 말하고 나니 당장 밑천이 바닥이 났더랬습니다. 이 앙상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추향 씨는 우리 나이로 마흔두 살이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동생이 둘 있고, 집이 너무 못살았다. 송추향 씨 어머니는 남해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역시 못살았지만 자기 아버지 몫으로만 올랐던 쌀밥을 받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자랐다. 그러다 결혼해서 송추향 씨를 임신했을 때 밀감이 먹고 싶었는데 살 돈이 없어서 밀감 껍데기를 씹어 먹었다고 했다.
송추향 씨 아버지 또한 남해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집이 못살았다. 장남이지만 공부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 부산에서 노가다를 하며 살다가 결혼해서 송추향 씨를 가졌다. 여전히 너무 못살아서 그 고단함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아내와 자식에게 풀고 살았다. 그러다 2002년 암에 걸려 비로소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송추향 씨 아버지의 노동 해방은 어머니의 노동 굴레로 넘겨졌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아이나 어르신을 돌보고, 보육 교사를 하고, 간간이 이삿짐 나르는 일을 했다. 그러다 콩팥에 병을 얻어 일주일에 이틀 투석하는 동안, 비로소 쉰다. 아직 노동에서 해방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아이 돌봄을 한다.
송추향 씨는 부모가 아직 젊을 때에 독립을 해서 식구들하고 크게 상관없이 살다가 18년 전에 아이를 가져 이듬해에 낳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몰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가 대학생은 육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길로 송추향 씨의 수정란에서 정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남자를 불러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남자가 아팠다. 몸이 아프자 정신도 황폐해져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송추향 씨는 어느 날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접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동안 안중에 없었던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기고 날마다 서울로 출근하고 부산으로 퇴근하며 살았다. 송추향 씨 전남편이 불쑥 부산 집에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송추향 씨 부모님은 군말 없이 손녀를 보내 주었다.
송추향 씨가 다시 아이를 되찾아올 때까지는 5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싸우고 어르고, 법정 다툼까지 한 뒤의 일이었다. 그 사이에 송추향 씨 딸은 아빠한테 많이 시달리며 살았다. 다시 돌아온 딸은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무엇보다 슬픔이 컸다. 그 쏟아 내는 것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송추향 씨는 ‘다 받아 줄 거야’라고 허풍을 떨었다. 그것이 허풍이었다는 것은 급격히 하얗게 센 머리칼 때문에 다들 눈치챌 수 있었다. 송추향 씨는 딸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너온 표식을 달아 주고 싶었다. 딸의 성을 송추향 씨 성으로 바꾸었다.
송추향 씨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스무 살이면 사람은 자기 밥벌이하며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니, 다시. 아이는 생긴 이상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송추향 씨가 여자니, 아이는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했다. 생리 기간에 수영장에 오지도 말라고 하고, 돈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엄마가 키우면 자식은 엄마 성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믿고, 나중에 그 자식이 크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여 살기를 바란다.
그 딸이 ‘지금까지는 엄마가 자기 눈치를 200만큼 보다가 이제는 자기 눈치를 100밖에 안 본다’며 불만을 표시할 때, 송추향 씨는 자기가 딸 눈치를 200만큼 보는 줄을 알아줘서 고마워했다. 또 자기가 딸 눈치 보는 일이 100으로 줄었을 때, 나머지 100은 딸이 자기 눈치를 보아 주는 거라고 여겨서 고마워했다.
혼자 날아다니며 살 것 같았던 송추향 씨는, 상태가 좀 괜찮아진 사춘기 딸과 이제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안중에 들어왔다. 그래서 더는 날아다니지 못하고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딸한테서 ‘엄마는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날씨가 흐린 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 고등학교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이 딸아이한테 ‘너에게 엄마란?’ 하고 물었는데 ‘고마운 존재’라고 답했다는 소식을 건너건너 듣고, 날씨가 참 좋다고 했다.
A4 용지 달랑 한 장이면 끝날 이 얄팍한 삶을 열여덟 번에 걸쳐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찮은 이야기에도 두 눈을 반짝, 두 귀를 활짝 해 주는 <작은책> 독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맨날 마감이 늦어 이쁜 이분 언니, 분이 나게 만들어서 미안했어요. 의식에 흐름에 따라 늘어놓는 구멍 숭숭 난 이야기에 늘 안성맞춤의 그림으로 단단히 메꾸어 주신 최정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 그림_ 최정규
내가 열여덟 번에 걸쳐서 쓴 것들은, 모두 그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책> 독자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쓰는 일의 무거움이 사라졌으니, 듣고 나누러 다니겠습니다. 특히 나에게 힘껏 말을 걸어 주신 해옥님, 대구여자님, 채민님, 정희님, 은숙님, 서해님. 아직도 괜찮다면, 늦더라도 꼭 갈게요!